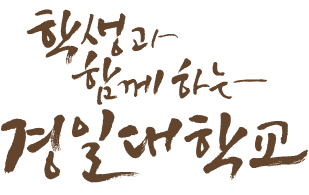제목한겨례 21- 작가 조춘만
- 작성자
- 이미경
- 작성일
- 2004/06/14
- 조회수
- 2493
(한겨례) 사진 아카이브의 지형도-다큐먼트’전… 공장홍보사진 · 다큐멘터리 · 개념미술 등 산업적 감수성 한데 모아
김수병 기자 hellios@hani.co.kr
전시- ‘산업’의 풍경을 기록한다
이탈리아의 시인 필리포 마리네티가 지난 1909년 파리에서 발표한 ‘미래주의 선언’은 기계의 미학을 이끌어냈다. 속도의 아름다움이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며 미래파 운동을 태동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속도감에 도취된 나머지 너무도 오랫동안 산업에 대한 성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기계는 거대한 괴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각인되면서 갈수록 소비자들로부터 멀어져만 갔다. 사실 우리가 산업체의 기계를 본다 해도 삭막하고 썰렁할 뿐이었다. 아주 특별한 눈이 있어야만 기계를 미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산업현장은 좀처럼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산업의 날재료를 시각적 표상화로
우리는 정말 산업을 보았던 것일까. 거대한 공장의 이미지는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속도감을 동반한다. 공장의 속도감은 뒤돌아볼 과거를 거세하고 말았다. 설령 돌아본다 해도 폐수와 오염 등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근대의 상징이던 ‘굴뚝’과 그 아래 거대한 산업설비들을 표상으로 느낀 사람들은 일단의 산업사진가들이었다. 폴 스트랜드의 산업사진은 산업적 오브제에 대한 경외와 신비감이 반짝이는 금속성의 표면을 담아냈고, 바우하우스는 기계에 의한 기능주의 미학을 오롯이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구의 산업을 보여주는 ‘그들만의 이미지’였을 뿐이다.
그동안 우리에게 산업은 어디에나 존재하면서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다.
고작해야 반공포스터와 함께 ‘산업역군’이나 ‘수출입국’ 같은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공공건물의 게시판을 채우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산업을 시각적 표상, 문화로서 향유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적 감수성’으로 무장해 공장을 배회하던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그들이 주목한 산업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오는 6월27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02-2124-8926)에서 열리는 ‘사진 아카이브의 지형도-다큐먼트’전은 산업이 공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의미의 영역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케 한다.
다큐먼트전의 3부로 마련한 ‘다큐멘테이션의 태도들’은 거대한 산업의 날재료에 문화적 향기를 입혔다. 산업현장을 홍보 목적으로 찍은 사진에서부터 산업적인 스펙터클에 대한 기록, 개념미술 방식으로 산업의 이미지를 탈신화화하는 이미지까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산업을 이미지로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 객원 큐레이터로 참여한 이영준(계원조형예술대·이미지비평가) 교수는 “산업의 스케일·층위 같은 공간적 좌표와 시간을 가로지르는 시간적 좌표를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과거를 보여주는 게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며 기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에서 자신의 시각으로 산업적 표상을 담아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대부분은 인천(백승철), 대구(구성수·신기선·김성훈·문상운), 울산(조춘만) 같은 공단지역에 흩어져 있던 지역의 사진가들이었다. 이 가운데 울산에서 활동하는 조춘만(50)씨의 이력은 독특하다. 그는 초등학교를 나온 뒤 열아홉 나이에 현대중공업에 입사해서 20대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지에서 배관·용접공으로 일했다. 그는 중동에서 돌아오며 ‘니콘 FM’ 카메라를 챙겨와 지역 사진교실에서 기본을 배운 뒤 동호인들과 활동하며 ‘사력’을 쌓았다.
처음에는 지역사회에서 현안으로 떠오르는 환경문제나 거대 공단에 잠식당해 사라져가는 풍경에 관심을 기울였다.
작가 조춘만 “현장경험 기록하고파”
“처음부터 산업사진을 찍지는 않았다. 차츰 산업시설의 웅장하고 거대한 스케일에 맘이 쏠렸다. 이제는 산업의 미세한 부분에 관심이 간다. 내가 건설현장에서 만들었던 배관 시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욕심도 있다.” 조씨는 사진 본래의 의도인 ‘기록’에 충실한 사진을 찍으려 한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찾아보려고 나이 마흔이 넘어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을 얻어 수능을 치른 뒤 경주 서라벌대와 경일대의 사진영상과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자신의 땀이 배인 파이프라인도 머잖아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요즘도 그는 대형 카메라를 챙겨 공단으로 간다.
산업의 날재료는 색다른 심상적 표상을 갖도록 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산업의 시공간적 변화를 읽게 하는 ‘흐름도’가 펼쳐지고 산업적 스케일을 가늠케 하는 사진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이 사진들은 산업의 웅장함이라는 기존 이미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지만 웅장함에 빠져들도록 하지도 않는다. 인천의 공단을 보여주는 거대 구조물과 울산의 산업설비 사이에 농촌 풍경을 담은 사진을 끼워넣는 식으로 ‘구멍내기’(puncture)를 시도한 때문이다. 그 뿌연 스캐닝 사진들은 근대화의 이면을 흉물스럽게 드러낸다. 산업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비판적 구경’을 통한 성찰이라는 전시 기획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진은 무엇일까. 요즘 ‘디카’와 ‘폰카’의 대중화로 온갖 영상기록이 온·오프라인에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기록은 낯설기만 하다.
일제의 강점과 수탈 그리고 전쟁의 상처 때문에 사진은 기록매체로서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다큐멘트전은 온전하지 못했던 기록매체로서 사진과 예술로서 사진 그리고 그 경계의 무너짐을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록하는 사진이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로 쓰이는 모습을 담은 <구보씨, 박람회에 가다>, 꾸밈없는 기록이 예술로 기능하는 현상을 주목한 <자료사진에서 사진예술로>, 그리고 우리에게 산업은 무엇인가를 사진으로 말하는 <다큐멘테이션의 태도> 등이 그것이다. 그 기록과 예술의 실체를 엿보며 우리가 살아온 근현대를 거닐고 싶지 않은가.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다음글
- 조선- 대학가 영어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