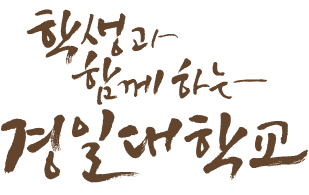제목[수요칼럼] 올림픽 야구가 남긴 교훈
- 작성자
- 이언경
- 작성일
- 2008/08/27
- 조회수
- 857
[영남일보] 2008/08/27
야구는 인생사의 축소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者가 승리
젊은이들 역할 모델 삼아야
지구촌 가족의 스포츠 제전, 하계 올림픽이 보름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엇갈린 시차로 전 국민이 몽유병 환자가 되어야 했던 예년 대회와 달리, 우리 이웃에서 펼쳐진 탓에 실시간으로 현장의 감동을 맛볼 수 있어 좋았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아시아의 전통적 맹주에서 세계의 거인으로 비상하려는 중국의 저력을 마음껏 과시한 이번 올림픽에서도 갖가지 화제가 만발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우리 선수단의 성적표인데,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금 13·은 10·동 8)을 거둬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다. 종주국의 위력을 한껏 뽐낸 태권도와 신궁의 탁월한 조준이 빛난 양궁을 위시해, '마린보이' 박태환의 수영, '헤라클레스' 장미란의 역도, '한판승 사나이' 최민호의 유도 등 모든 종목에서 태극전사들은 빼어난 기량으로 염제에 지친 서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달래주었다.
이처럼 이번 대회에서 획득한 모든 메달이 소중하고 자랑스럽지만, 그 중에서도 폐막 전날 전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야구 금메달'의 감격은 아직까지 가슴을 떨리게 한다. 흔히들 스포츠 세계의 불가사의한 본질을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술어로 풀이하지만, 이번 올림픽 야구 시합처럼 극적인 승부사(勝負史)는 일찍이 없었다. 쿠바와의 마지막 결승전 9회말, 푸에르토리코 구심의 석연찮은 볼 판정으로 초래된 1사 만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쿠바의 타자가 때린 내야 강습성 빠른 타구를 유격수 박진만이 '두꺼비가 파리를 잡아먹듯' 날름 낚아채 병살 처리한 순간, 가슴 졸이며 TV 화면을 응시하던 국민들의 하나된 함성이 아파트촌의 음산하고 둔탁한 콘크리트벽을 마구 흔들어댔다.
애초 우리 대표팀은 동메달을 목표로 삼았다. 아마 야구 세계 최강으로 올림픽의 단골우승팀인 쿠바, 올림픽 우승에 사활을 걸고 최강의 프로 정예팀을 보낸 일본, 비록 메이저리거들이 빠졌지만 야구 종가의 관록에 빛나는 미국 등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동메달 획득마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었다. 특히 역사적·지정학적으로 숙명적 대립각을 세워온 일본과의 대결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프로야구의 역사에서 46년이나 앞서며 선수층, 야구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한 일본이지만, 2006년 WBC에서 두 번이나 패하는 등 근자에 바짝 다가선 한국의 추격세에 위협을 느끼던 그들로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에서 확실히 한국의 콧대를 눌러놓을 필요가 있었다.
일본의 호시노 감독은 전승 우승의 금메달을 장담하며 용렬한 언행으로 한국을 자극해 왔다. 예선에서 한국에 충격적 패배를 당한 뒤에도 그의 교만은 그치지 않았다. 쿠바를 피하고 한국과 재대결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기에서 고의성 짙은 패배를 감수했다. 투수들은 볼 배합 없이 직구만을 던졌고 타자들은 '묻지마 스윙'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만만히 고른 한국에 이승엽의 홈런 한 방으로 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그는 풀죽은 얼굴로 "더 이상 한국은 약팀이 아닌 강팀"이라며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야구는 인생사의 축소판이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승리를 선사한다. 작전구사의 융통성이 봉쇄된 2사 후에 오히려 점수가 많이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9전승 우승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야구의 겸손하고 성실한 투혼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역할모델을 삼았으면 좋겠다.
이남교<경일대 총장>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